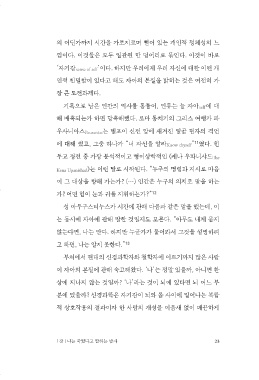Page 23 -
P. 23
의 어딘가까지 시간을 가로지르며 뻗어 있는 개인적 정체성의 느
낌이다. 이것들은 모두 일관된 한 덩어리로 묶인다. 이것이 바로
‘자기감 sense of self’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개
인적 친밀함이 있다고 해도 자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가
장 큰 도전과제다.
기록으로 남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늘 자아 self 에 대
해 매혹되는가 하면 당혹해했다. 로마 통치기의 그리스 여행가 파
우사니아스 Pausanias는 델포이 신전 앞에 새겨진 일곱 현자의 격언
11
에 대해 썼고, 그중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였다. 힌
두교 경전 중 가장 분석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케나 우파니샤드 The
Kena Upanishad》는 이런 말로 시작된다. “누구의 명령과 지시로 마음
이 그 대상을 향해 가는가? (…) 인간은 누구의 의지로 말을 하는
가? 어떤 힘이 눈과 귀를 지휘하는가?” 12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는 동시에 자아에 관해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봐서 그것을 설명하려
13
고 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부처에서 현대의 신경과학자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
이 자아의 본질에 관해 숙고해왔다. ‘나’는 정말 있을까, 아니면 환
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라는 것이 뇌에 있다면 뇌 어느 부
분에 있을까? 신경과학은 자기감이 뇌와 몸 사이에 일어나는 복합
적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한 사람의 개성을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1장 |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