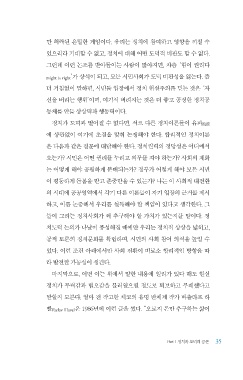Page 12 -
P. 12
만 허락된 은밀한 게임이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정치에 대해 어떤 도덕적 비판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논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차츰 ‘힘이 권리다
might is right’가 상식이 되고, 모든 시민사회가 도덕 비판성을 잃는다. 좀
더 거침없이 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정치 현실주의를 믿는 것은 ‘자
신을 버리는 행위’이며, 여기서 버려지는 것은 더 좋고 공정한 정치공
동체를 만들 상상력과 행동력이다.
정치가 도덕과 떨어질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정치이론들이 유파 流波
에 상관없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쟁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치이론
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민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져야 하는가? 사회의 재화
는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모든 시민
이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사회적 대전환
의 시대에 공공영역에서 각기 다른 이론들이 자기 입장의 근거를 제시
하고, 이를 논증해서 우리를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들이 그리는 정치사회가 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정
치도덕 논의가 나날이 풍성해질 때에만 우리는 정치적 상상을 넓히고,
공적 토론의 정치문화를 확립하며, 시민의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만 사회 전환이 비로소 합리적인 방향을 따
라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위에서 말한 내용에 일리가 있다 해도 현실
정치가 무력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퇴보하고 부패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얼마 전 작고한 체코의 유명 반체제 작가 바츨라프 하
벨 Vaclav Havel은 1986년에 이런 글을 썼다.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삶이
Part 1 정치와 도덕의 공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