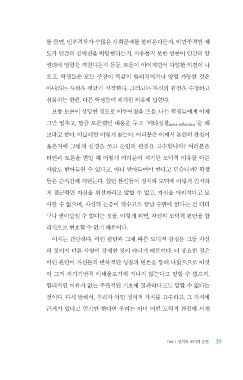Page 16 -
P. 16
를 들면, 빈부격차가 수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온다든지, 비민주적인 제
도가 인간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든지,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 인간의 알
권리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등등. 토론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
오고, 학생들은 모든 주장이 똑같이 합리적이거나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고
심화하는 한편, 다른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에 답한다.
보통 토론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을 즈음, 나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 멈추고, 방금 토론했던 내용을 두고 ‘메타성찰 meta-reflection’을 해
보라고 한다. 이를테면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은 어째서 본인의 관점이
옳은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본인의 관점을 고수합니까? 여러분은
타인과 토론을 벌일 때 어떻게 여러분이 제기한 도덕적 이유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까? 학생
들은 순식간에 깨닫는다. 일단 본인들이 정치와 도덕에 이렇게 진지하
게 접근하면 자신을 위선자라고 말할 수 없고, 자신을 어리석다고 묘
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논증이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건 더더
구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합
리적으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치는 간단하다. 이런 판단과 그에 따른 도덕적 감정은 그들 자신
의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판단이 자신들의 반복적인 성찰과 변론을 통해 나왔으므로 이것
이 그저 자기기만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주관적인 기호에 불과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가치를 고수하고, 그 가치에
근거가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도덕적 관점에 서게
Part 1 정치와 도덕의 공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