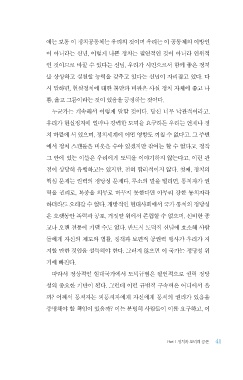Page 18 -
P. 18
에는 보통 이 정치공동체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이방인
이 아니라는 신념, 이렇게 나쁜 정치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인 것이므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우리가 시민으로서 함께 좋은 정치
를 상상하고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다
시 말하면,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사실 정치 자체에 좋고 나
쁨,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리가 현실정치에 얼마나 강력한 도덕을 요구하든 우리는 언제나 정
치 바깥에 서 있으며, 정치세계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그 주변
에서 정치 스캔들을 비웃을 수야 있겠지만 참여는 할 수 없다고. 정작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런 관
점이 상당히 유행하고는 있지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첫째, 정치의
핵심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다. 루소의 말을 빌리면, 통치자가 권
력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 개방적인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
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으며, 신비한 종
교나 오랜 전통에 기댈 수도 없다.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
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
지할 만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가는 정당성 위
기에 빠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현대국가에서 도덕규범은 필연적으로 권력 정당
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런데 이런 규범적 구속력은 어디에서 올
까? 어째서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자신에게 통치의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이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를 요구하고, 이
Part 1 정치와 도덕의 공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