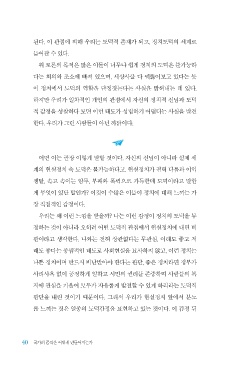Page 17 -
P. 17
된다. 이 관점에 의해 우리는 도덕적 존재가 되고, 정치도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위 토론의 목적은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정치의 도덕은 불가능하
다는 회의와 조소에 빠져 있으며, 세상사를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이 정치에서 도덕의 역할을 단정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차적인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도덕
적 감정을 성찰하다 보면 이런 태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까닭이다.
어떤 이는 곧장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실제 세
계의 현실정치 속 도덕은 불가능하다고. 현실정치가 권력 다툼과 이익
쟁탈, 속고 속이는 암투,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한데 도덕이라고 말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수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가
장 직접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왜 이런 느낌을 받을까? 나는 이런 감정이 정치의 도덕을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현실정치에 내린 비
판이라고 생각한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무관심, 이래도 좋고 저
래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회현실을 묘사하지 않고,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이며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는 판단, 좋은 정치라면 정부가
사리사욕 없이 공정하게 일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복
지에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하리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정치 앞에서 분노
를 느끼는 것은 일종의 도덕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정 뒤
40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