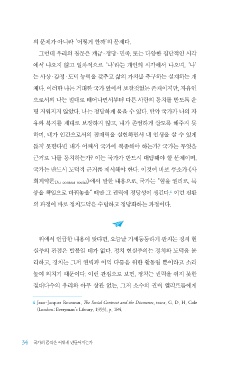Page 11 -
P. 11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계급·정당·민족, 또는 다양한 집단적인 시각
에서 나오지 않고 일차적으로 ‘나’라는 개인의 시각에서 나오며, ‘나’
는 사상·감정·도덕 능력을 갖추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재하는 개
체다. 이러한 나는 거대한 국가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자유인
으로서의 나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도록 운
명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정당하게 물을 수 있다. 만약 국가가 나의 자
유와 복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내가 존엄하게 살도록 해주지 못
하며, 내가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돕지 못한다면 내가 어째서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통치하는가? 이는 국가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는 반드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사
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에서 말한 내용으로, 국가는 “힘을 권리로, 복
4
종을 책임으로 바꿔놓을” 때만 그 권력에 정당성이 생긴다. 이런 전환
의 과정이 바로 정치도덕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다면, 오늘날 기세등등하게 판치는 정치 현
실주의 관점은 발붙일 데가 없다. 정치 현실주의는 정치와 도덕을 분
리하고, 정치는 그저 권력과 이익 다툼을 위한 활동일 뿐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치는 권력을 쥐지 못한
절대다수의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그저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에게
4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the Discourses, trans. G. D. H. Cole
(London: Everyman’s Library, 1993), p. 184.
34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