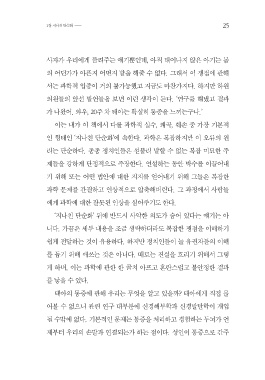Page 6 -
P. 6
1장 지나친 단순화 25
사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뿐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몸
의 어딘가가 아픈지 어떤지 말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쟁점에 관해
서는 과학적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원
의원들의 앞선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연구를 해냈고 결과
가 나왔어. 와우, 20주 차 태아는 확실히 통증을 느끼는구나.’
이는 내가 이 책에서 다룰 과학적 실수, 왜곡, 훼손 중 가장 기본적
인 형태인 ‘지나친 단순화’에 속한다. 과학은 복잡하지만 이 오류의 원
리는 단순하다. 종종 정치인들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주
제들을 강하게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연설하는 동안 박수를 이끌어내
기 위해 또는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은 복잡한
과학 문제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압축해버린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에게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지나친 단순화’ 뒤에 반드시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는 아
니다. 가끔은 세부 내용을 조금 생략하더라도 복잡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늘 유권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실을 흐리기 위해서 그렇
게 하며, 이는 과학에 관한 한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태아의 통증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태아에게 직접 물
어볼 수 없으니 관련 연구 대부분에 신경해부학과 신경발달학이 개입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문제는 통증을 처리하고 경험하는 두뇌가 언
제부터 우리의 손발과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성인이 통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