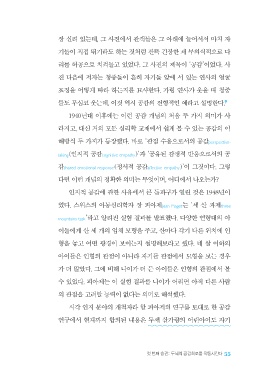Page 17 -
P. 17
장 실려 있는데, 그 사진에서 관객들은 그 아래에 늘어서서 마치 자
기들이 직접 뛰기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긴장한 채 무의식적으로 다
리를 허공으로 치켜들고 있었다. 그 사진의 제목이 ‘공감’이었다. 사
진 다음에 저자는 청중들이 흔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연사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따라 하는지를 묘사한다. 가령 연사가 웃을 때 청중
9
들도 무심코 웃는데, 이것 역시 공감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한다.
1940년대 이후에는 이런 공감 개념의 처음 두 가지 의미가 사
라지고, 대신 거의 모든 심리학 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감의 이
해방식 두 가지가 등장했다. 바로 ‘관점 수용으로서의 공감 perspective-
taking(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과 ‘공유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공
감 shared emotional response(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이 그것이다. 그렇
다면 이런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지적 공감에 관한 사유에서 큰 돌파구가 열린 것은 1948년이
었다.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는 ‘세 산 과제three
mountains task’라고 알려진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
이들에게 산 세 개의 입체 모형을 주고, 산마다 각기 다른 위치에 인
형을 놓고 어떤 광경이 보이는지 설명해보라고 했다. 네 살 이하의
아이들은 인형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 관점에서 모형을 보는 경우
가 더 많았다. 그에 비해 나이가 더 든 아이들은 인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제는 이 실험 결과를 나이가 어리면 아직 다른 사람
의 관점을 고려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시각 인지 분야의 개척자라 할 피아제의 연구를 토대로 한 공감
연구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두세 살가량의 어린아이도 자기
첫 번째 습관: 두뇌의 공감회로를 작동시킨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