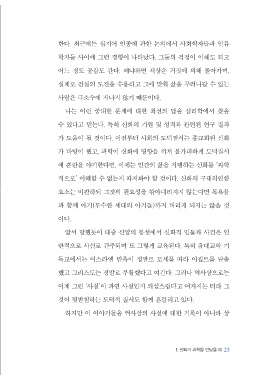Page 18 -
P. 18
한다. 최근에는 심지어 인종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학자들과 인류
학자들 사이에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공감도 간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에 의해 돌아가며,
실제로 진실의 도전을 수용하고 그에 맞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신화의 기원 및 성격과 관련된 연구 결과
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부터 사회의 도덕질서는 종교화된 신화
가 바탕이 됐고, 과학이 신화에 영향을 끼쳐 불가피하게 도덕질서
에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신화를 ‘과학
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신화의 구태의연한
요소는 비판하되 그것의 필요성을 깎아내리지지 않는다면 목욕물
과 함께 아기(무수한 세대의 아기들)까지 버리게 되지는 않을 것
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중 신앙의 통설에서 신화적 인물과 사건은 일
반적으로 사실로 간주되며 또 그렇게 교육된다. 특히 유대교와 기
독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
했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역사상으로는
이제 그런 ‘사실’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 터라 그
것이 뒷받침하는 도덕적 질서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역사상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상
1. 신화가 과학을 만났을 때23